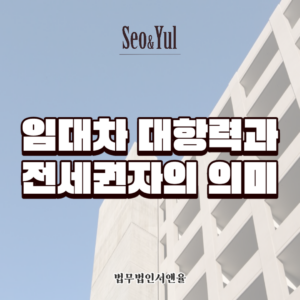임대차의 대항력과 전세권자의 의미
2010년대까지만 해도 전세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전세로 살며 이자 갚는 것이 돈을 아끼는 방향이라고 알려져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들어 우후죽순으로 발생한 빌리왕,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등의 사건들로 인해 ‘전세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게 되었는데요.
전세에 대한 일련의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알고도 당한다는 것이 전세 사기인데,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하겠죠.
오늘은 임대차의 대항력과 전세권자의 의미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임대차의 대항력이란?
임대차라는 단어는 월세나 전세와 같은 형태의 부동산 거래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임대로 부동산을 이용하고 계약 만료가 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제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대차의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를 한 곳에 지속적으로 점유를 함으로써 형성되는데요.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목적물에 거주하며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만약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서 점유하고 있지않아도 임차권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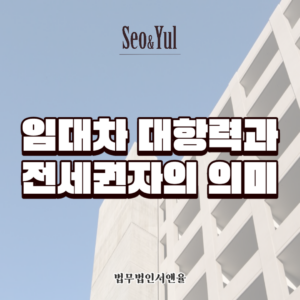
전세에 산다고 모두가 전세권자는 아니기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 전세로 임대차를 계약하고 살고 있다 하여 모두 ‘전세권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세의 형태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것과 전세권자의 지위를 갖는 것은 차이가 있죠.
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하여 거주하는 것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임차권자’입니다.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임차권자는 보증금을 돌려 받을 권리인 ‘채권’을 가진 자입니다.
반면에, 전세권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설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채권’이 아니라 ‘물권’에 해당하죠.
전세권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부동산의 경매 청구가 가능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전세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임차권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즉각적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고, 그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기반으로 강제 경매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세권자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 한 후, 등기소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되는데요.
등기까지 마치면 등기부 등본의 ‘을구’에 전세권 설정의 목적으로 등기가 설정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간단한 과정이긴 하지만 임차인이 단독으로 진행이 불가 하므로 등기의무자인 임대인과 등기권리자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등기를 진행해야 하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준비해야 하는 서류 또한 존재하는데 이를 준비하기에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의 대항력과 전세권자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세권자와 임대차 대항력에 관해 더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서앤율의 블로그 blog.naver.com/fides99 를 방문하셔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여기를 클릭하셔서 상담 예약하시고 조언 받아보세요!